신약 개발 위한 비윤리적 임상시험 비난 거세…한편에서 의약품 특허소송 잇따라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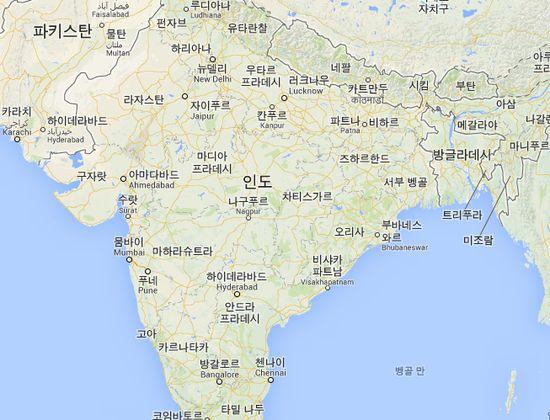
전세계 다국적 제약사의 약 40%가 인도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계획이며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릴리, BMS, 등 상당수의 다국적 제약사가 인도에서 기존 임상 연구투자 및 인프라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인도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보편적인 질환 발생율은 높은 반면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비율이 높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환자 비율이 5% 미만인 반면 인도는 환자 모집이 이보다 5~10배 정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인도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선호하는 이유 중에는 낮은 임상비용도 포함된다.
인도에서의 임상비용은 서구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에 비해 5배 가까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글로벌 금융업체 Rabo India Finance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의 임상 1상 비용은 미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상 및 3상 역시 60% 이하에 불과했다.그러나 인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상시험 중 상당수는 환자의 동의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임상시험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인도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임상시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00명 가까이 된다.
지난해 인도의 의료윤리 전문가 찬드라 굴하티 박사는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를 통해 “2005년부터 15만명의 인도인이 최소 1600건의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이 중 1,730여 명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망했다”며 “그러나 10개 대형 제약사가 사망자 22명에게 보상한 금액은 1인당 평균 약 3,000파운드(약 54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찬드라 굴하티 박사는 “임상시험 참가자 대부분이 빈민가에 사는 문맹이었고 상당수는 자신이 어떤 조건 아래서 실험에 참가하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더욱 충격적”이라며 제약사들의 비윤리적 임상시험 형태를 비난했다.
실제로 인도 인도르시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부터 2010년 사이 22개 다국적 제약사들은 인도르시 국립병원에서 실시된 3,300건 이상의 임상시험중 중 1,800건이 환자의 정식 동의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들은 임상시험에 따른 사망사고를 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아닌 환경적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 다국적제약사는 “신약실험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윤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는 “임상시험 과정 중 사망한 것은 부작용보다는 건강상태와 환경 때문”이라고 발뺌했다.

다국제 제약사들의 의약품 특허 소송으로 몸살 앓는 인도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를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인도에서 전세계 복제의약품의 20% 이상을 공급해 왔고, 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의 90%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인도는 ‘의약품 특허의 무덤’과 같은 곳이다.
당연히 인도 내에서 이들 제약사에 의해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이 적지 않다.
노바티스가 대표적이다. 이 제약사는 최근까지 인도에서 진행된 글리벡 특허권 독점 소송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 4월 인도대법원은 7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노바티스가 제기한 글리벡 특허권 요구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노바티스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사용해 1999년 개발한 글리벡의 화학구조 형태를 변경, 2000년대에 다시 특허를 신청했다.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를 부분적으로 바꾸는 식으로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은 '거대 제약사들의 폭리 추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당시 인도에서는 글리벡 복제약이 생산돼 1개월치 복용하는데 10만원대 비용이 소요됐지만 오리지널 약의 경우 1개월치에 200만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따랐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는 글리벡의 특허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빗발쳤고, 지난 2006년 인도 특허청은 새로운 의약품이나 기존 약품의 효능을 확실히 개선한 제품에만 특허를 인정한다는 자국 특허법을 근거로 글리벡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새 글리벡이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효능이 있어 특허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도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인도 연방특허위원회가 GSK의 유방암 치료제 '타이커브'의 경미한 변형판에 대한 특허출원을 기각했다.
또 이달 들어서는 인도 콜카다 특허청이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헵틴'의 변형판에 대한 특허출원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미국혈액학회지 ‘Blood’에는 전세계 15개국의 암 전문가 121명이 공동으로 다국적제약사의 높은 약가를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들은 “백혈병 환자의 생존률이 기대치보다 낮은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약가 때문”이라며 “다국적 제약사들은 도덕성을 상실했다. 지금의 약가는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 지속이 어렵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겨냥해 “노바티스는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며 “저개발 국가의 환자뿐 아니라 미국의 암환자들도 천문학적 약가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난과 달리 노바티스는 얼마 전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빈곤층에 부담가능한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230개 이상의 영리기업 연합체인 GBCHealth로부터 ‘헬스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 농촌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영리적 목적의 사회적 비즈니스 프로젝트이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500명 이상의 보건교육자들과 의약품 영업책임자들을 교육하고, 인도내 3만3,000개 마을 4,20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인도에서 글리벡을 독점하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혜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정보공유연대 권미란 운영위원은 “노바티스는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가 아니라 자기들이라고 주장한다”며 “인도에서 활동하는 NGO들에 따르면 실제로 노바티스로부터 지원받는 이들은 전체 국민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권 위원은 “특허권 독점 소송 등을 통해 글리벡의 약가 정책은 그대로 고수하려 하면서 환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시혜성 접근에 불과하다”며 “이런 행태는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